
아버지라는 이름. 지금은 아버지라는 이름은 친근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했죠. 가부장적 사회여서일까요? 아버지는 다가가기 힘든 존재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은 많질 않네요. 아버지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왜 아버지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나요?”라고 물어본 기억도 없어요.
아버지와의 즐거운 추억은 없지만 아버지는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표현하라면 ‘뛰어난 손재주를 자랑하는 분’이라고 답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전기며 수도며, 미장까지 솔직히 못하는 게 없던 분이었죠. 집 뒷마당엔 닭을 키우기도 했어요. 닭을 키우려면 닭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뚝딱뚝딱’ 손을 대면 금세 닭장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자라왔어요.
여름철엔 모기가 득실거리죠. 요즘은 좋은 방충망이 있고, 업체를 불러다가 방충망 시설을 하곤 하죠. 그런 방충망 시설을 집에서 직접 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망을 가져온 뒤 나무졸대에 망을 직접 이어붙입니다. 그러면 방충망이 완성되죠.
아버지는 만능이었어요. 전에 TV 드라마로 인기가 있던 맥가이버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뭐든 잘하는 이를 흔히들 맥가이버라고 부르죠. 제겐 아버지가 바로 맥가이버였음을 고백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엔 잘사는 집보다는 그렇지 않은 집이 훨씬 많았죠. 제가 살던 곳도 그랬으니까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넉넉지 않은 공간에 한 가족이 모여 살던 때입니다. 아버지는 허튼 곳에 돈을 들이는 법도 없었어요. 혹시 ‘까까머리’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네요. 1970년대 그 시절에 중학교를 다닌 이라면 ‘까까머리’에 대한 애틋한 기억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당시엔 스님처럼 완전히 밀어버리면 반항을 한다고 혼을 나곤 하기에,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걸 일본말로 ‘이부가리’라고 하죠. 두 푼 정도만 남겨두는 걸 말해요. 그것보다 좀 더 길게 남기는 걸 ‘삼부가리’라고 부르곤 했죠. ‘이부가리’나 ‘삼부가리’를 하려면 이발소에 가야 하지만 아버지는 바리캉을 사다가 직접 제 머리카락을 손질해준 분입니다. 간혹 바리캉에 머리카락이 끼는 경우가 있지만요.

갑자기 옛 일이 떠오르네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이기도 한 황선미의 <내 푸른 자전거>는 아버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내 푸른 자전거>에 등장하는 찬우 아빠도 제 아버지처럼 손재주가 무척 뛰어납니다. 그러나 일을 나갔다가 두 손가락의 끝마디가 잘려나가 한동안 우울해 합니다. 그러다 찬우 아빠는 자전거방을 열어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하죠. 찬우는 그런 아빠를 곁에서 지켜보다가 자신도 가족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려고 몰래 자전거를 고치곤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찬우는 자전거 펑크를 때운 걸 아빠에게 들키고 맙니다. 찬우 아빠는 무척 화가 났는지 “땜질해서 먹고살래? 누가 이런 짓 하랬냐”며 화를 냅니다.
사실 찬우네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찬우 엄마는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찬우는 뭔가 도우고 싶었던 겁니다. 찬우의 땜질이 들통이 난 뒤 찬우 아빠는 더 큰 돈벌이가 있다며 몇 개월간 집을 비웁니다. 그 사이에 찬우는 아빠의 자전거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남몰래 일을 해서 자전거방을 지켜냅니다. 아빠의 흔적이라서 그랬겠죠. 여름에 떠난 아빠는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겨울이네요. 유독 찬바람이 부는 그날은 집에서 구수한 찌개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찬우는 직감을 합니다. 아빠가 온 것이죠. 자전거방에 갔더니 아빠였어요. 찬우 아빠는 조립해 둔 새 자전거가 두 대나 있는데 또 새것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주문을 받았느냐’는 찬우의 말에 “특별 주문이다. 아주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답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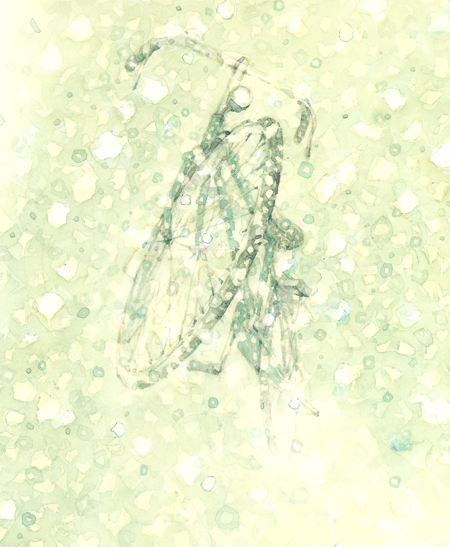
‘특별주문’을 받았다는 자전거는 날마다 모습을 달리합니다. 찬우는 눈 내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로 아빠가 나타납니다. ‘특별주문’을 받았다는 그 자전거를 끌고서요. 찬우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드냐?”
<내 푸른 자전거>는 찬우 친구의 이야기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제겐 찬우 친구보다는 찬우 아빠에 모든 게 꽂힙니다. 찬우 아빠를 바라보면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 이젠 아버지를 바라보던 아이가 두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맥가이버이던 아버지는 이젠 팔순을 넘기셨고, 이젠 제게 더 이상 맥가이버의 손놀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버지의 아들은 두 딸을 위해 맥가이버로 환생을 했어요. 맥가이버 아버지에 비하면 실력이 턱없이 낮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제게 이럽니다.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